-
동낚인 쉼터
우리나라 위인 중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위인이 있으니 그 위인은 바로 백제의 충장(忠將) 계백이다.
계백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사서에는 다만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을 막다가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은 후세에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장수이다.
그는 김유신이라는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영웅이다.
우리는 삼국통일의 주역하면 김유신을 떠올리고, 이순신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군을 꼽으라면 김유신을 꼽는다.
하지만 김유신이 과연 명장이고, 지장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가 뛰어난 장군은 확실하다. 하지만 사서에 기록된 그의 전공과 당시 신라의 국세를 보면
김유신의 전공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서에는 김유신이 항상 고구려, 백제와 싸우면 승승장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에게 많은 땅을 빼앗기고, 결국 당에 사신을 보내 비굴한 외교를 펼친다.
만약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김유신이 항상 승리하는 상승의 장군이었다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음은 물론,
고구려, 백제와 대등한 강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게 많은 땅을 빼앗긴 약소국이다.
그래서 당에 가서 당의 대군이 아니면 우리 신라는 멸망하니 우리를 구해달라는 비굴한 외교를 펼친다.
이렇듯 신라는 약소국이었다. 그런데 김유신이 백제군 몇 만명을 도륙했다는 기록은 무엇을 말할까?
이는 김유신의 조그만 전공을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할 때 과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김유신의 전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김유신이 이처럼 늘 승리를 거두었다면 백제의 국토가 몹시 쇠퇴했을 것인데 당서(唐書)에는
신라 사신 김법민(金法敏)의 구원을 청한 말에 “큰 성과 요긴한 진(鎭)이 다 백제가 차지한 바가 되어 국토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옛 땅도 도로 찾는다면 강화를 청하겠습니다. (大城重鎭 竝爲百濟所竝 疆宇日蹙 ---但得古地 卽請交和)”라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태종대왕이 백제를 정벌하고자 당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일찍이 혼자 앉아 있으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太宗大王 欲伐百濟 請兵於唐 嘗獨坐 憂形於色)”고 하였다.
이때에 백제는 성충(成忠) · 윤충(允忠) · 계백(階伯) · 의직(義直) 등 어진 재상과 이름난 장수가 수두룩하고,
사졸들은 숱한 싸움을 겪어서 도저히 신라의 적이 아니었으니
김유신이 몇 번 변변찮은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었는지 모르지마는 기록과 같이 공이 혁혁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신라가 당에 청병을 할 때 고구려와 백제가 자주 침탈해서 자국의 영토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김유신의 전공에 관련된 사적은 작은 승리는 과장하고 패전은 감춘 것이라는 신채호 선생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신채호 선생은 김유신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요,
그 평생의 큰 공이 싸움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운 거다.
무지한 사람은 김유신이 최종 승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
물론 김유신이 최종 승자이다. 하지만 단지 최종 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장 뛰어나다는 말은 역사를 무시하는 멍청한 소리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왜 계백이 왜 뛰어난 위인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의하면 계백 장군은 출전에 앞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전한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락해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손수 처자를 죽인 계백의 처사는 가혹한 게 아니라 당시의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오히려 뜨겁고 지극한 가족애(家族愛)요, 인간애(人間愛)의 발로였다.
계백은 또한 절박하고 극한상황인 전투 중임에도 적장의 무용(武勇)을 아끼고 사랑하여 소년 화랑 관창을 살려 보냄으로써
도량 넓은 덕장(德將)의 풍모를 보였으며, 죽을 때와 자리를 바로 찾아 비장한 최후를 맞은 진정한 무인(武人)이었다.
게다가 그는 지형조건이 불리한 황산벌에서 그것도 5천이라는 적은 군사로 5만이라는 신라의 대군을 맞아 네 번 싸워
네 번 이긴 영웅이었다. 이는 그가 장수로서, 전략가로서의 재능이 김유신보다 월등했음을 뜻한다.
만약 계백의 전략, 전술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텐데 참 아쉽다 할 수 없다.
황산벌에서 네 번 싸워 신라군이 1만이나 전사하자 김유신은 간사한 계략을 써 겨우 겨우 백제의 결사대를 물리친다.
김유신은 승리를 하기 위해 젓비린내가 가지 않은 16세의 관창을 계백의 진영에 내보낸다.
하지만 계백은 그의 무용을 높이 사 그를 다시 신라 진영으로 보낸다.
하지만 전공에 앞선 김유신과 김품일은 관창을 계속 계백의 진영에 보내고 결국 계백은 관창을 죽이고
그 수급을 김유신의 진영에 보낸다.
승리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들을 보며
관창을 죽일 수 밖에 없는 계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자신이 죽인 아이들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라군의, 김유신의 간교함을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660년 7월 10일 온종일 계속된 싸움에서 5천 결사대는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계백 또한 충장산으로 불리는 수락산 아래에서
수십, 수만의 신라군에게 포위된 채 혈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니 계백의 최후는 곧 백제의 최후나 마찬가지였다.
5천명 중에서 가까스로 참살을 면해 포로가 된 자가 좌평 충상(忠常)과 상영 등 20여명이라고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전한다.
돌이켜보건대 신라 소년 화랑 반굴과 관창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전투 중인 그 같은 시급하고 절박한 극한상황 아래서도 적장의 용장한 기상을 사랑하고 아껴서 살려 보낸
계백 장군이야말로 참으로 뜨거운 인간애를 실천한 도량 넓은 대장부요, 민족의 거인이라 하겠다.
또한 황산벌전투(黃山筏戰鬪) 하나만 두고 볼 때에도 계백이 김유신보다 탁월한 장수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전투는 결과적으로 계백과 백제군 결사대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름만 결사대였지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허약한 5천명의 군세로 5만명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대군을 맞아
초전에서 네번이나 격퇴한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김유신이 반굴과 관창 등 어린 화랑들을 희생시키는 교육책을 쓰지 않았고,
계백에게 만일 군사들을 보충할 여유가 있었다면 전쟁의 결과는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가정은 아무 소용도 없으니 어찌하랴.
이 황산벌전투(黃山筏戰鬪)가 계백과 백제군 결사대의 장렬한 전몰로 끝나고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123년간의 영화를 자랑하던 백제의 도성 사비성은 맥없이 함락되고 낙화암, 대왕포의 한 맺힌 전설을 남긴 채
7백년 백제사(百濟史)는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소정방의 13만 대군은 좌평 의직의 방어군을 격파하고 백강(白江)을 거슬러 올라와 7월 11일 김유신의 신라군과 합류하여
사비성을 포위하니, 의자왕과 태자 효(孝)는 웅진으로 달아났다가 7월 18일 투항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계백은 죽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충정과 그의 전략과 무용은 후세 사람인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 남음이라.
김유신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웅, 백제의 혼 계백을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계백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사서에는 다만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을 막다가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은 후세에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장수이다.
그는 김유신이라는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영웅이다.
우리는 삼국통일의 주역하면 김유신을 떠올리고, 이순신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군을 꼽으라면 김유신을 꼽는다.
하지만 김유신이 과연 명장이고, 지장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가 뛰어난 장군은 확실하다. 하지만 사서에 기록된 그의 전공과 당시 신라의 국세를 보면
김유신의 전공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서에는 김유신이 항상 고구려, 백제와 싸우면 승승장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에게 많은 땅을 빼앗기고, 결국 당에 사신을 보내 비굴한 외교를 펼친다.
만약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김유신이 항상 승리하는 상승의 장군이었다면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음은 물론,
고구려, 백제와 대등한 강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게 많은 땅을 빼앗긴 약소국이다.
그래서 당에 가서 당의 대군이 아니면 우리 신라는 멸망하니 우리를 구해달라는 비굴한 외교를 펼친다.
이렇듯 신라는 약소국이었다. 그런데 김유신이 백제군 몇 만명을 도륙했다는 기록은 무엇을 말할까?
이는 김유신의 조그만 전공을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할 때 과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김유신의 전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김유신이 이처럼 늘 승리를 거두었다면 백제의 국토가 몹시 쇠퇴했을 것인데 당서(唐書)에는
신라 사신 김법민(金法敏)의 구원을 청한 말에 “큰 성과 요긴한 진(鎭)이 다 백제가 차지한 바가 되어 국토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옛 땅도 도로 찾는다면 강화를 청하겠습니다. (大城重鎭 竝爲百濟所竝 疆宇日蹙 ---但得古地 卽請交和)”라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태종대왕이 백제를 정벌하고자 당에 군사를 청하였는데 일찍이 혼자 앉아 있으면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太宗大王 欲伐百濟 請兵於唐 嘗獨坐 憂形於色)”고 하였다.
이때에 백제는 성충(成忠) · 윤충(允忠) · 계백(階伯) · 의직(義直) 등 어진 재상과 이름난 장수가 수두룩하고,
사졸들은 숱한 싸움을 겪어서 도저히 신라의 적이 아니었으니
김유신이 몇 번 변변찮은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었는지 모르지마는 기록과 같이 공이 혁혁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신라가 당에 청병을 할 때 고구려와 백제가 자주 침탈해서 자국의 영토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김유신의 전공에 관련된 사적은 작은 승리는 과장하고 패전은 감춘 것이라는 신채호 선생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신채호 선생은 김유신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요,
그 평생의 큰 공이 싸움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운 거다.
무지한 사람은 김유신이 최종 승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
물론 김유신이 최종 승자이다. 하지만 단지 최종 승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장 뛰어나다는 말은 역사를 무시하는 멍청한 소리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왜 계백이 왜 뛰어난 위인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의하면 계백 장군은 출전에 앞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전한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락해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손수 처자를 죽인 계백의 처사는 가혹한 게 아니라 당시의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오히려 뜨겁고 지극한 가족애(家族愛)요, 인간애(人間愛)의 발로였다.
계백은 또한 절박하고 극한상황인 전투 중임에도 적장의 무용(武勇)을 아끼고 사랑하여 소년 화랑 관창을 살려 보냄으로써
도량 넓은 덕장(德將)의 풍모를 보였으며, 죽을 때와 자리를 바로 찾아 비장한 최후를 맞은 진정한 무인(武人)이었다.
게다가 그는 지형조건이 불리한 황산벌에서 그것도 5천이라는 적은 군사로 5만이라는 신라의 대군을 맞아 네 번 싸워
네 번 이긴 영웅이었다. 이는 그가 장수로서, 전략가로서의 재능이 김유신보다 월등했음을 뜻한다.
만약 계백의 전략, 전술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텐데 참 아쉽다 할 수 없다.
황산벌에서 네 번 싸워 신라군이 1만이나 전사하자 김유신은 간사한 계략을 써 겨우 겨우 백제의 결사대를 물리친다.
김유신은 승리를 하기 위해 젓비린내가 가지 않은 16세의 관창을 계백의 진영에 내보낸다.
하지만 계백은 그의 무용을 높이 사 그를 다시 신라 진영으로 보낸다.
하지만 전공에 앞선 김유신과 김품일은 관창을 계속 계백의 진영에 보내고 결국 계백은 관창을 죽이고
그 수급을 김유신의 진영에 보낸다.
승리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희생시키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들을 보며
관창을 죽일 수 밖에 없는 계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자신이 죽인 아이들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라군의, 김유신의 간교함을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660년 7월 10일 온종일 계속된 싸움에서 5천 결사대는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계백 또한 충장산으로 불리는 수락산 아래에서
수십, 수만의 신라군에게 포위된 채 혈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니 계백의 최후는 곧 백제의 최후나 마찬가지였다.
5천명 중에서 가까스로 참살을 면해 포로가 된 자가 좌평 충상(忠常)과 상영 등 20여명이라고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전한다.
돌이켜보건대 신라 소년 화랑 반굴과 관창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전투 중인 그 같은 시급하고 절박한 극한상황 아래서도 적장의 용장한 기상을 사랑하고 아껴서 살려 보낸
계백 장군이야말로 참으로 뜨거운 인간애를 실천한 도량 넓은 대장부요, 민족의 거인이라 하겠다.
또한 황산벌전투(黃山筏戰鬪) 하나만 두고 볼 때에도 계백이 김유신보다 탁월한 장수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전투는 결과적으로 계백과 백제군 결사대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름만 결사대였지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허약한 5천명의 군세로 5만명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대군을 맞아
초전에서 네번이나 격퇴한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김유신이 반굴과 관창 등 어린 화랑들을 희생시키는 교육책을 쓰지 않았고,
계백에게 만일 군사들을 보충할 여유가 있었다면 전쟁의 결과는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가정은 아무 소용도 없으니 어찌하랴.
이 황산벌전투(黃山筏戰鬪)가 계백과 백제군 결사대의 장렬한 전몰로 끝나고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123년간의 영화를 자랑하던 백제의 도성 사비성은 맥없이 함락되고 낙화암, 대왕포의 한 맺힌 전설을 남긴 채
7백년 백제사(百濟史)는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소정방의 13만 대군은 좌평 의직의 방어군을 격파하고 백강(白江)을 거슬러 올라와 7월 11일 김유신의 신라군과 합류하여
사비성을 포위하니, 의자왕과 태자 효(孝)는 웅진으로 달아났다가 7월 18일 투항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계백은 죽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충정과 그의 전략과 무용은 후세 사람인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 남음이라.
김유신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웅, 백제의 혼 계백을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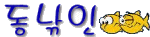



역사는 후손들이 말한다 합니다
하지만,그때는상황이나 가치관이 지금과는많이 다르니...
뭐라 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