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낚인 쉼터
카메라 vs 과속차량 ‘도로위 과학대전’
"이동식 카메라 함정단속 왜 하나" 차 없어 무심코 밟았는데 '찰칵'
[서울신문]‘500m 앞에 과속 위험구간입니다. 70㎞ 이하로 서행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와 과속 감지 카메라와의 쫓고 쫓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고정식은 물론 커브길 등에 숨긴(?) 이동식 카메라로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한 갖은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러면 과속 감지 카메라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까. 과연 단속 카메라 방해 장치들은 효과가 있을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 악명을 떨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파동의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것이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 건’의 작동원리와 같다.
누구나 앰뷸런스가 다가올수록 ‘앵∼앵’하는 사이렌 소리가 더 촘촘하고 높은 소리로 바뀌며, 멀어지면 느슨하고 낮은 소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다.
서울 명덕고 이세연 교사는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 등을 내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면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달리는 자동차에 쏜 뒤 반사돼 되돌아 오는 파동의 변화량을 측정해 속도를
감지한다. ”고 설명했다. 즉, 차량에 부딪혀 되돌아온 파동은 도플러효과 때문에 처음 발사된 것보다 파장이 짧아지며 주파수는 커진다.
이 주파수의 차이를 통해 주행 속도를 측정한다.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밑에 숨겨놓은 자기장 감지 ‘센서’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한다. 통상 카메라에서 30m 정도 떨어진 도로 밑에 첫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번째 센서를 묻는다.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속도로 환산한다. 때문에 단속카메라 앞 30m 정도
까지 과속을 했다면 이후 속도를 줄인다 해도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속도 측정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유도 전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도로 밑 센서에는 ‘유도 코일’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교류가 약하게 흐르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위를 금속 물체인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세밀하게 측정하면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테두리에서 빛을 내는 ‘반사 보조번호판’과 ‘꺾기 번호판’달기,CD판 붙이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로 감지하기….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묘책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소용없는 짓이다.
단속 카메라의 플래시 빛을 반사시켜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염상훈 경위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반사 각도를 정확히 맞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동식은 차량 옆쪽에서 찍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 ”고
설명했다. 특히 GPS를 이용한 감지기는 단속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대해서는 감지해 내지 못한다. 염 경위는 “이동식 카메라가 쏘는 레이저 신호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동식 카메라 함정단속 왜 하나" 차 없어 무심코 밟았는데 '찰칵'
[서울신문]‘500m 앞에 과속 위험구간입니다. 70㎞ 이하로 서행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도로 위에서는 운전자와 과속 감지 카메라와의 쫓고 쫓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고정식은 물론 커브길 등에 숨긴(?) 이동식 카메라로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한 갖은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러면 과속 감지 카메라는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까. 과연 단속 카메라 방해 장치들은 효과가 있을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 악명을 떨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파동의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한 것이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 건’의 작동원리와 같다.
누구나 앰뷸런스가 다가올수록 ‘앵∼앵’하는 사이렌 소리가 더 촘촘하고 높은 소리로 바뀌며, 멀어지면 느슨하고 낮은 소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다.
서울 명덕고 이세연 교사는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 등을 내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면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달리는 자동차에 쏜 뒤 반사돼 되돌아 오는 파동의 변화량을 측정해 속도를
감지한다. ”고 설명했다. 즉, 차량에 부딪혀 되돌아온 파동은 도플러효과 때문에 처음 발사된 것보다 파장이 짧아지며 주파수는 커진다.
이 주파수의 차이를 통해 주행 속도를 측정한다.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밑에 숨겨놓은 자기장 감지 ‘센서’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한다. 통상 카메라에서 30m 정도 떨어진 도로 밑에 첫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번째 센서를 묻는다.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속도로 환산한다. 때문에 단속카메라 앞 30m 정도
까지 과속을 했다면 이후 속도를 줄인다 해도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속도 측정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유도 전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도로 밑 센서에는 ‘유도 코일’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전류인 교류가 약하게 흐르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위를 금속 물체인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세밀하게 측정하면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테두리에서 빛을 내는 ‘반사 보조번호판’과 ‘꺾기 번호판’달기,CD판 붙이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로 감지하기….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묘책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소용없는 짓이다.
단속 카메라의 플래시 빛을 반사시켜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염상훈 경위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반사 각도를 정확히 맞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동식은 차량 옆쪽에서 찍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 ”고
설명했다. 특히 GPS를 이용한 감지기는 단속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이동식 카메라에 대해서는 감지해 내지 못한다. 염 경위는 “이동식 카메라가 쏘는 레이저 신호를 감지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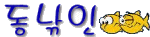



피해해야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ㅋㅋ